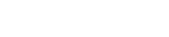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우리는 성황당과 서낭당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황당과 서낭당은 그 탄생 배경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조성제(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우리는 성황당과 서낭당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황당과 서낭당은 그 탄생 배경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1904년 외국인 밀러 부르다레(mile Bourdaret)가 본 성황당에 대한 기록이다. Song-hang-Sine이라는 것은 성(城), 촌락(村落), 지방(地方) 또는 도시의 신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행여(行旅)를 안전하게 하고 도중에 악령 등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 그들을 식재(息災) 초복(招福)을 위하여 이에 기원을 드린다. 이때 제물을 바치는 단(壇)을 그들은 선왕당이라고 한다. 도로의 옆, 촌락의 부근, 원야(原野)의 한 구석, 길가 등 도처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제단은 소석(小石)의 퇴적(堆積)으로써 되어 있고 그 퇴적은 통행인들이 던진 한 개 한 개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누석단(累石壇)은 수목 또는 총림(叢林)의 밑에 쌓여 있거나, 또는 장승 옆에 쌓여 있기도 하며, 때로는 산신당 곁에서도 볼 수 있다.
산신당이라는 것은 토석(土石) 또는 토목(土木)으로써 이룩하고 기와 또는 짚으로 이은 작은 집으로서 그 안에는 산신의 숭배 대상인 동물의 솜씨 없는 화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선왕당의 수목의 가지에서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은 포편(布片. 베조각), 지편(紙片. 한지조각), 오색면편(五色帛片. 오색비단조각), 의편(衣片. 옷), 모발(毛髮), 기혈(器血. 그릇에 담은 피), 전화(錢貨. 돈과 재물) 등이 무수히 걸려 있다.
전화(錢貨)는 재리(財利)를 획득하기 위하여, 포편(布片)은 아동의 장수를 빌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은 것이다. 상인은 재리(財利)를 얻기 위하여 짚 세기의 작은 것 또는 상품을 거는 일도 있다.
오색면편(五色帛片)을 거는 것은 신랑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새집으로 옮겨갈 때 부모계의 가신(家臣)이 그를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만약 이를 막지 못하면 부모의 집은 망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보편적인 신앙이다.
신부가 자기의 의복을 일편(一片 )찢어서 선왕당의 나뭇가지에 건다는 것은 부모의 가신이 그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 그들은 이 누석단과 관목(灌木. 신이 내린 나무)에 대하여 이를 읍락, 촌락의 수호신 또는 산신 또는 행여(行旅. 여행자)의 신이라고 믿고 있다. 더욱이 부인들은 때때로 어린아이의 질병 쾌유를 기원하기 위하여 밥 한 그릇을 석단위에 차려놓고 꿇어앉아서 두 손을 모아 기원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 밥을 가지고 가서 병든 아이에게 준다.
무녀도 또한 이곳에서 병든 아이를 위하여 장고(杖鼓) 또는 발라(鉢鑼)를 치며 제의를 지내는 일도 있다. 통행인은 나그넷길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하여 헌납(獻納) 하는데 그것은 극히 간단한 일로써 작은 돌을 석단 위에 던지거나, 또는 그에 향하여 침을 뱉으면 된다. 침을 뱉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악령 즉, 부귀(浮鬼)를 두려워하는 조선 사람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 죽은 자의 영(靈)으로써 도로에 배회하는 악령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경기 황해 지방에서는 선왕당(先王堂)으로 통칭하여 불려진다. 이 선왕당이 변하여 서낭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황당은 고려 문종 때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사(城隍祠)를 둔 것이 성황의 시초라 한다. 그 뒤 고려에서는 각 주부현(州府縣)마다 서낭을 두고 이를 극진히 위하였는데, 특히 전주성황이 유명하였다. 고려 고종은 침입한 몽고병을 물리치게 된 것이 성황신의 도움 때문이라 하여 성황신에게 신호를 가봉하였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부도지』는 성황당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신앙이며 바로 소도를 대신하는 지방의 작은 소도(蘇塗)라고 하였다.
그러니 성황당과 서낭당은 형태와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
서낭당은 고목과 소석(小石)의 퇴적(堆積)인 누석단(累石壇)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퇴적은 통행인들이 던진 한 개 한 개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마을의 수호신이나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여행의 신(神)의 역할도 한다.
서낭당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은 나그넷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헌납(獻納) 하는데 그것은 극히 간단한 일로써 한 조각의 작은 돌을 석단 위에 던지거나, 그에 향하여 침을 뱉으면 된다. 죽은 자의 영(靈)으로써 도로에 배회하는 악령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황당은 치우와 풍백, 우사, 운사를 모시거나 그 지방의 영웅을 모셔 놓고 마을과 주민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성소로 성역화되어 있다. 경기 동서문외 소신사(小神祠) 성황당 중앙에는 <南無城皇大神之位> 좌측에는 <南無三神之位> 그리고 우측에는 <南無后口阿氏之位>를 모셔 두었다. 여기서 공통점은 바로 세분의 신이 모두 여신이다.
성황당은 관 또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축조한 당이 존재하는 반면, 서낭당은 누석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또 성황당은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낭은 산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손진태는 <조선민속문화의연구>에서 누석단(累石壇)은 원래 산신(山神)이요, 경계신(境界神)임과 동시에 산신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고 하였으니 주로 바닷가에 세워진 성황당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