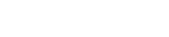이경국(칼럼니스트. 박약회 운영위원)계절이 더위를 먹었는지 가을에 장맛비가 내리더니 수시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러다간 만추(晩秋)에도 비가 내릴 것만 같다.
이경국(칼럼니스트. 박약회 운영위원)계절이 더위를 먹었는지 가을에 장맛비가 내리더니 수시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러다간 만추(晩秋)에도 비가 내릴 것만 같다.
가랑비인지 이슬비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모처럼 집에 오신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는 '가랑비' 인지 아니면 친정어머니께서 더 있으라고 내리는 '이슬비'인지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자연도 인간의 성미를 닮아서 시도 때도 없이 기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금은 높은 하늘에 비늘구름이 반짝이면서 허공에는 고추잠자리가 가득한 연중 가장 좋은 가을 날씨이다. 고추잠자리마저 개체 수가 줄어 들어서 보호 곤충이 되었다니 제비처럼 볼 수가 없는 날이 올지 모를 일이다.
비가 내리면 설사 아픈 과거일지라도 추억을 작은 분실에서 꺼내어 생각에 잠기곤 한다.
사실 이런 날은 지금의 주식, 비트코인, 금괴 하다못해 아파트 시세 등에 신경을 쓰지를 말고 소싯적 따뜻한 온돌방에 동리 처녀들과 모여 앉아서 정담(情談)을 나누던 기억을 소환해 본다.
얇은 홑이불에 발을 묻고 있어도 누구의 발인지 다 알았던 시절이었다. 군것질이 귀하던 시절 볶은 콩이면 시간 보내기에 최고였다.
자고로 볶은 콩과 이쁜 처녀와 주식 살 돈(예탁금)은 가까이 있으면 손이 자주 간다는 말이 있긴 하다.
옛 얘기가 꽃을 피우던 소싯적 동무들은 벌써 초로(初老)의 할미가 되어 안부 전화가 오는데 내용이 한결같다. ''별일 없지?''다.
뭐 다른 말은 사실 필요가 없다. 아마 아내와 잘 지내고 있으며, 건강은 어떠한지 안부 전화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나이가 47세였는데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으면서 안부를 전하는 친구가 있어 마냥 행복하다. 다만 아프지 않고 지내는 것이 작금에 와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가랑비가 내리든 이슬비가 오든 관여할 바 아니다. 방안에 행복의 쌍무지개가 뜨는 기분이면 족하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의 오후는 이렇게 감미롭다.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고인(故人)이 된 최헌의 노랫가락이 떠오른다. 이슬은 어쩌면 먼저 떠난 이의 눈물일지 모른다.
누구나 지나간 불꽃(old-flame)에 대한 연민의 정은 남아 있기 마련일 것이다. 비 내리는 가을 날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면서 세상 얘기를 많이 나눈 친구도 인연이 흩어지니 떠나 버리고 말았다.
5천 년 가난 속에서 등교길의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많이 보였었다. 지금은 집집마다 고급 우산이 즐비하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은 신발장의 신발과 우산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좁다란 등굣길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도 옛 얘기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도로는 넓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거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대이다.
오동잎이 한 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지금은 사계절이 두서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다.
필자는 언젠가 하루에 4계절을 다 경험한 적이 있었다. 지구에서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 말고는 지극히 드문 현상일 것이다.
학창 시절의 신발주머니와 비 오는 날의 우산은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다. 큼직한 골프우산으로 등교를 하는 세상이다.
찢어진 비닐우산을 좀체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